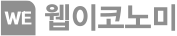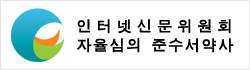[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차량 3대 가운데 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가 조사 대상 제작사 중 가장 많은 총 7대 차종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결함이 발생해 리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단 소속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를 전달받아 분석‧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적합판정을 받았던 국산‧수입 승용차 50종 가운데 15종에서 완충‧제동‧조향장치 등에 관한 총 18건의 제작결함이 발생해 시정조치가 리콜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수입사별로 현대자동차가 4종으로 전체 대상 회사 중 가장 많았고 이어 기아자동차 3종, 르노삼성자동차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 각각 2종,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가 각각 1종 씩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제작결함이 발생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의 실제 기준 충족 여부를 국토부가 성능시험대행자(연구원)로 하여금 조사하는 제도다.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를 시정조치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공단은 국토부로부터 매년 40억원 안팎의 국비를 지원받아 20종·70대 가량의 시험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
주로 신차 또는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과 그동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조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구입 대상이며 수입차는 예산범위 내에서 제작사‧차종별로 배분해 선정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측은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사가 제대로 자기인증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검증절차”라며 “이를 통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결함현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박 의원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기인증적합 판정이 난 차량에서 탑승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용돼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동차안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을 뜻한다.
규칙 제14조 제1항 제7조에는 ‘조향장치의 결합구조를 조절하는 장치는 잠금장치에 의해 고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이 지난 2015년 4월 구입해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내린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의 지프 컴패스(가솔린) 차량은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호스를 고정하는 부품의 장착 불량으로 호스가 이탈돼 오일이 샐 경우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지난 2016년 3월 리콜 조치됐다.
또한 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상 완충장치의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원이 지난 2016년 4월 구입해 적합 판정을 내린 현대자동차의 투싼(디젤)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디젤)는 지난해 1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강도 부족 등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제동 시 쏠림현상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각각 리콜 조치됐다.
같은 차종에서 리콜이 두세 차례 반복되거나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까지 확인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아자동차 쏘울(가솔린)은 지난 2015년 3월 가속페달 결함, 같은해 11월과 지난 2017년 11월 조향핸들 축 볼트 결함이 발견돼 3차례 리콜이 단행됐다.
또 FCA코리아 짚 컴패스 차종에서는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호스를 고정하는 부품의 장착불량으로 호스가 이탈돼 오일이 샐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당시 자동차 안전기준에 의한 ‘조향성능시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험차 구입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안전기준에 의한 시험평가 항목도 크게 늘려 영역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제작사나 수입사에게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율성이 부여돼 있는 만큼 제작결함 발생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